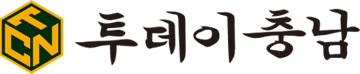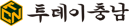공주시가 17년 동안 씨름 인재를 키워 놓고도 정작 그 결실을 다른 지자체에 헌납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상표 공주시의원이 지적한 “밑 빠진 독”이란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공주시는 지난 2008년 공주시청 씨름팀을 해체한 뒤 지금까지 신관초·봉황중·공주생명과학고 씨름부에만 18억 원의 시비를 투입했다. 전국 최강의 인프라를 공공 자금으로 갖춰놓고도 정작 열매는 영암군·수원시·울주군 실업팀이 가져가고 있다. 이보다 더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한 체육행정이 또 있을까.
공주는 이미 ‘씨름의 도시’로 불릴 만큼 우수한 인재 배출 기반을 갖췄다. 공주생명과학고는 대통령기 대회 우승을 비롯해 전국체전 메달을 휩쓸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씨름의 최고 요람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들이 졸업하면 갈 곳은 없다. 공주시에는 실업팀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주가 공들여 키운 인재는 타 지자체 실업팀의 유니폼을 입고 전국 방송에 등장한다. 공주는 비용만 대고, 다른 지역이 브랜드를 가져가는 구조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한라장사 12회’ 김기태 감독(영암군청), ‘금강장사 21회’ 임태혁 선수(수원시청), ‘한라장사 7회’ 김무호 선수(울주군청)이다. 모두 공주 출신이다. 대한민국 씨름계를 움직이는 핵심 인재들이지만, 공주의 이름이 적힌 샅바를 매고 경기에 나선 적은 없다. 공주시가 이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더욱 아이러니한 장면도 있다. 공주시는 최근 공주 알밤한우 홍보대사로 임태혁 선수를 위촉했다. 그러나 그는 공주시청 소속 선수가 아니다. 공주의 아들이지만 공주의 유니폼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공주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모순적 행정은 공주 체육정책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다. 애초 실업팀이라는 ‘그릇’이 존재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지만, 공주는 이 불합리한 구조를 고쳐야 할 책임이 있다.
씨름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한민국 전통문화이자, 공주가 품고 있는 백제 각저 문화의 계승이다. 여기에 지역경제 효과는 이미 다른 지자체가 증명했다. 괴산군은 씨름대회 한 번 유치로 1,700명의 방문객과 5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냈고, 영암군은 장사급 선수단 운영을 통해 도시 브랜드가 전국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공주시가 ‘씨름 경제’의 가치를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이상표 의원이 제기한 ‘신관초-봉황중-공주생명과학고-공주시청’으로 이어지는 K-씨름 인재 육성 파이프라인 구축은 단순한 스포츠 정책이 아닌 공주의 미래 브랜드 전략이다. 인재를 키우고, 실업팀으로 흡수하고, 전국대회와 방송 노출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며, 전통문화를 현대 스포츠로 재해석하는 종합적 도시 가치 전략이다. 이런 구조를 외면한 채 18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어 타 지역에 인재를 퍼주는 현 체계야말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책 실패다.
이제 공주시에 필요한 것은 결단이다. 실업팀 재창단, 전용 훈련시설 조성,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은 핑계의 영역이 아니다. 이미 공주는 17년 동안 방관했고, 그 사이 씨름계는 공주 출신 인재로 전국을 점령했다. 문제는 그들의 유니폼이 ‘공주시청’이 아니라는 사실뿐이다.
스포츠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굴뚝 없는 산업’이다. 공주는 전국 최강의 인재를 보유하고도 그 산업적·문화적 잠재력을 단 한 번도 활용하지 못했다. 17년의 공백은 이제 끝나야 한다.
공주의 아들이 타향의 이름으로 경기에 나서는 일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공주시청 씨름팀 재창단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사업이 아니라, 공주가 더 이상 무능한 체육행정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지금 공주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결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