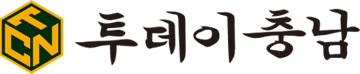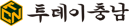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례없는 행정도시 개발 과정에서 상업용지가 과도하게 공급되고, 행정기관 중심의 인구 배치가 고착화되면서 상권 분산은 필연적이었다. 그 결과 수년째 건물 곳곳에 빈 점포가 늘어가고, 도시 활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의회가 연구모임까지 꾸려 상가 공실 해법을 모색하고 최종보고회를 열었다는 사실은 행정이 놓친 숙제를 대신 떠안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연구모임은 나성동·대평동·어진동 일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 창업 특구 조성 △문화예술 창업 특구 도입 △‘세종형 캡슐호텔’ 설치 등 구체적 대안을 내놓았다. 단순한 공실 활용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도시 기능과 지역 특성, 인구 흐름을 반영한 생활권 기반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성동에 신기술 창업기업을 유치하고, 대평·어진동을 소규모 문화 창작 공간으로 육성하며, 숙박 취약 지역에 캡슐호텔을 설치해 관광·체류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은 상권의 구조적 문제를 해석한 결과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문제의 진단과 대안 마련에 앞장선 곳이 ‘시의회’라는 점이다. 원래 이러한 도시 정책 설계와 공급관리 역할은 행정의 몫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시의회가 민간 전문가와 손잡고 발로 뛴 반면, 집행부는 아직 가시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대응 지연을 넘어 행정 기능이 도시경제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경고로 읽혀야 한다.
세종시가 안정적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다. 이미 지어진 도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량이다. 공실률은 도시 활력의 바로미터다. 점포가 비어 있다는 것은 소비가 사라졌다는 뜻이고, 소비가 사라지면 일자리는 줄고, 그 도시의 미래 경쟁력은 흔들린다. 민간의 자생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도시경제는 공공정책과 시장이 맞물릴 때 살아난다. 그렇기에 이번 연구 결과는 이제 행정이 응답해야 할 과제다.
세종시 행정은 더 이상 “시장 논리”를 내세워 수수방관할 수 없다. 신도시 특성상 초기 수요산정 오류는 인정할 수 있으나, 현재는 대응의 시기다. 지구단위계획 상의 업종 제한 조정,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 문화·관광 연계 인프라 구축, 유휴공간 공유 체계 구축 등 제도적·재정적 정책 수단이 행정 손에 있다. 특히 조례 개정과 예산 반영까지 시의회가 의지를 밝힌 만큼, 집행부는 ‘추진력’으로 답해야 한다.
세종시가 자족도시를 꿈꾼다면, 그 출발점은 비어있는 상가에 불을 켜는 일이다. 이제 명확하다. 아이디어는 나왔다. 답은 현장에 있고, 공은 행정으로 넘어갔다. 세종시가 더 이상 ‘계획 도시’라는 이름에 안주하지 않고 ‘운영 도시’로 진화하기 위해, 집행부는 실천의 속도와 책임으로 보여줘야 한다. 시민들은 구호가 아닌 결과를 원한다. 지금이 바로 세종시 행정이 도시 미래를 증명해야 할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