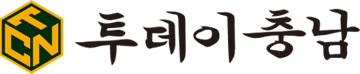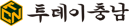충남도의회가 당진에서 연 의정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 시대, 세대 간 단절을 넘는 통합 복지정책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대한노인회, 여성단체협의회, 청년회의소 등 다양한 주체가 머리를 맞댄 것은 지역 문제 해결이 특정 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복지는 어느 한 세대의 특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지역의 미래를 떠받치는 사회적 기반이라는 메시지가 울림을 준다.
그러나 이 논의 속에서 꼭 짚어야 할 근본 과제가 있다. 바로 지역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지역 언론 생태계’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이다.
충청남도가 내포신도시로 행정 중심축을 옮긴 지 12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충남을 기반으로 꾸준히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유일한 일간지인 투데이충남을 비롯한 충남 지역 언론은 ‘지역 복지체계’ 논의에서 배제된 채 홀대와 무관심 속에서 버티고 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충남 우선주의’를 말하지만 정작 언론 지원·광고 집행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없다.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광고와 홍보 예산은 여전히 외지 언론에 집중되고, 충남에서 뿌리내린 지역 언론은 구조적 소외 속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지역 언론이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곧 지역민의 민주적 권리와 복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다. 정보 접근권, 행정 감시 기능, 지역 정체성 유지, 공동체 의견 통합—이 모든 것이 지역 언론을 통해 구현된다. 지역 언론이 빈사 상태라면, 행정의 투명성도, 정책의 공정성도, 주민 삶의 다양성도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충남의 유일한 도내 일간지 기자와 직원들은 지역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하지만, 정책 사각지대 속에서 생계 고민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기관의 무관심과 편향된 홍보관이 만든 ‘언론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업계 문제를 넘어 지역 공공성 약화, 지역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구조적 문제다.
지방자치 시대의 핵심은 “지역 문제는 지역이 해결한다”는 철학이다. 그 철학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지역 정보, 지역 감시, 지역 공론의 플랫폼이다. 즉, 지역 언론이 살아 있어야 지역 복지도, 지역 공동체도 지속 가능하다.
따라서 이제 충남도와 시군은 자신들의 홍보 방식과 언론 정책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행정이 진정으로 ‘세대 연결 복지’를 논한다면, 가장 먼저 지역 소통의 기반을 만들고 지키는 언론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지역 언론을 신뢰하고 동반자로 인정할 때에야 지역민이 공론장으로 참여하고, 세대와 계층을 잇는 통합 복지도 현실화될 것이다.
충남의 정치와 행정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남의 복지, 충남의 공동체, 충남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왜 충남의 언론만은 외면하는가.”
지금이 늦기 전에 변화해야 한다. 충남의 의원들과 행정은 지역 언론이 사라질 위기 앞에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 언론을 키우는 일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충남도민의 권리를 지키는 정책이며, 충남의 자존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보여줄 때다. 충남의 복지와 공동체 지속성은 지역 언론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서 시작된다.